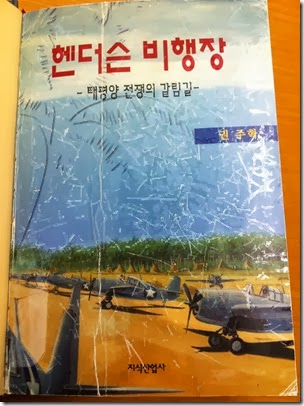얼마 전에 볼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있는데 다 봤다. 더 퍼시픽, 태평양 전쟁 이야기다. 태평양 전쟁은 사실 노르망디나 롬멜, 서부전선 이야기에 비하면 아는 게 거의 없다. 진주만과 미드웨이, 노몬한과 만주,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뭐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맘 편하게 볼 수도 없다.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였다. 더 퍼시픽 처음에 과달카날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달카날에 비행장을 만든 사람들은 징집된 조선인들이다(아래 이야기 할 책 '헨더슨 비행장'에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론은 약간 있지만 결코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글로세스, 이오지마, 오키나와 다 마찬가지다.
1944년부터 조선도 징집이 시작되었으니(그전까지는 강제 모병) 이 영화에서 잽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죽어나간 사람들 사이에 대체 몇 명이나 우리 할아버지 격 되는 분들이 껴 있는지 알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자료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여기선 줄인다. 태평양 전쟁 전체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이 드라마는 전투의 측면에서 훨씬 미시적인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위에서 잠깐 말했듯 더 퍼시픽은 과달카날, 글로세스, 펠렐리우, 이오지마, 오키나와 전투를 다룬다. 미 해병대 제 1사단이 참가한 전투들인데 과달카날과 이오지마, 오키나와 말고는 처음 들어본다. 펠렐리우 전투에서는 다 합쳐서 미 해병대만 6,000여명이 전사했다는데(공식적으로 미군 1,794명, 일본군 10,695명이 전사) 어쩜 이렇게 낯설지.
지금은 무인도가 태반인 태평양 가운데 섬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해병대의 역할은 간단하다. 일본군이 외딴 섬에 활주로를 만든다 -> 요새화 시킨다 -> 그러므로 그걸 뺏기위해 미 해병대가 상륙한다 -> 싸운다. 필리핀, 호주, 괌, 하와이를 지척에 둔 작은 섬들에서 이런 전투가 수도 없이 벌어졌다.
언젠가부터(내 기억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상륙 작전의 두근거림을 극대화시키는 영화들이 꽤 많다. 어두컴컴한 함내에서 두근거리며 전장으로 다가간다. 갑판문이 열리고 해병을 잔뜩 태운 암트랙이 바다로 들어간다. 총알과 포가 계속 날아오고 이윽고 해변에 도착하면 날아오는 포탄 속에서 내린다. 그리고 해변을 올라가기 시작한다.
노르망디나 펠레리우나 반대쪽 입장도 마찬가지다. 멀리 배들이 잔뜩 등장하고 폭탄이 쉼없이 날아든다. 기관총을 꼭 붙잡고 숨죽이며 기다린다. 이윽고 함정의 갑판들이 열리고 군인을 잔뜩 실은 수륙양용차들이 구름같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그들이 내리기 시작하고 그걸 막는다. 정글과 요새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된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계속 반복된다.
이건 뭐... 미친 짓이다. 펠렐리우에서 이런 짓을 몇 달을 계속 했다는데 사람이 안 미칠 수가 없다. 전쟁의 참혹함 입장에서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보다 더 퍼시픽이 훨씬 더 끔찍하다. 영화의 주제가 전쟁과 정신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전부 다 미쳐간다.
잘 모르는 내용이 많아 몇 가지 책을 찾아봤는데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종교 이야기 등등이 읽는 이를 당혹스럽게 만들지만 '헨더슨 비행장'이 더 퍼시픽에 나오는 전투와 주변의 정황을 파악하는데 적합했다. 더 자세한 책들도 있겠지만 사태 파악을 하는데는 이 책과 웹 서핑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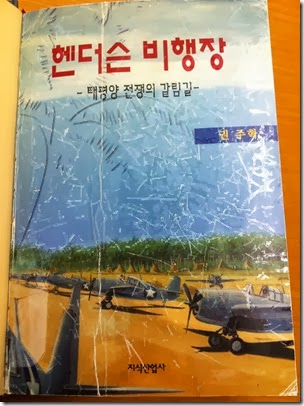
엔하위키의 이오지마 전투를 보면 이오지마 상륙 작전이 만든 처참한 미군의 피해가 원자폭탄 투하를 보다 쉽게 결정하게 된 계기라는 흥미로운 견해가 있다(링크). 제네레이션 킬은 볼까 말까 싶다.